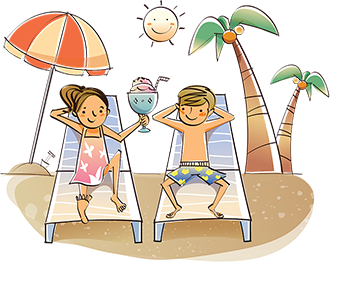■ 1904.8.22. 제1차 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등)
-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
고종(高宗) 재위 1904.2.8. 일본은 만주 여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개전(開戰) 후 서울을 점령해 2.23. 동맹국 중 일방이 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공격할 감행할 경우 함께 방어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동맹(攻守同盟)의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강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화의 길을 만들었다.
이어 8.22. 한일양국의 항구적인 친교를 유지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시정(施政)개선 충고를 받아들이고, 일본정부 추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그의 의견을 들어 일체 재무사항을 시행하고, 한국정부는 외국과 조약체결·중요외교안건은 미리 일본정부와 상의하도록 하는 이 한일협약을 채결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 작업은 한 발짝 더 진전되었고, 대한제국의 수많은 이권과 재산이 일본에 넘어갔고, 외교권도 제한되었다. 이 협정은 병가 낸 외무부대신 이하영을 대체한 외무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하였다.

■ 1905.11.17.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또는 乙巳條約 을사늑약)
-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
고종(高宗) 재위 1905.11.17. 체결된 이 조약은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하였다.
1905.11.17. 경운궁(慶運宮) 주변을 일본군이 포위한 가운데,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는 입궐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정 대신 개개인에게 조약 체결 찬반 여부를 물었고, 8명의 대신 중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1919),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934)이 찬성 의사를 표하였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각국 재외공관이 폐지되고,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두는 외교사항 관할 직책 통감을 신설하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한국통감(1906.3.2.~1909.6.13.)에 부임했다.

■ 1907.7.24. 제3차 한일협약(韓日新協約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
- 한일협약(韓日協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일본 원본은 일한협약이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7.7.2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과 한국통감(韓國統監)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조약으로 이완용이 순종의 재가와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서 7.24. 밤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택에서 대한제국 한국정부는 시정(施政)개선에 통감(統監) 지도, 법령제정 및 중요행정상 처분 사전 통감 승인,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 고등관리(高等官吏) 임명·해임은 통감 동의로 집행, 통감추천 일본인 한국관리로 임명, 통감 동의 없이 외국인 초빙 고용 금지, 1904.8.22.(메이지 37년) 조인한 제1차 한일협약 제1항(일본정부 추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그의 의견을 들어 일체 재무사항을 시행) 폐지 등 7개 조항의 한일신협약(이른바 정미칠조약)을 체결·조인하였다. 이 협약 체결 후 경찰권은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시정개선을 위해 통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며, 관리의 임용과 추천도 통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인들을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이 시대 인물
● 이완용(李完用 現 경기 성남시 출생 ): 1858.7.17.~1926.2.11. 사망(67세)|1907.6.24.~1910.8.29. 제16대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

● 고종(高宗): 1852.8.27.~1919.1.21. 사망( 향년 66세)|재위기간: 1864.1.21.~1907.7.19.|조선 제26대 국왕|본명: 이재황(李載晃)→이형(李㷗)|대한제국 초대 황제(皇帝)

● 순종(純宗): 1874.3.25.~1926.4.25. 사망( 향년 52세)|재위기간: 1907.7.22.~1910.8.29.|조선 마지막 제27대 국왕|본명: 이척(李坧)|대한제국 제2대 황제(皇帝)

●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명치천황): 1852.11.3. 출생~1912.7.29. 22시 43분 사망( 향년 59세)|재위기간: 1867.2.13.~ 1912.7.30.|제122대 천황|본영: 사치노미야 무쓰히토(睦仁 목인)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 1841.10.16.~1909.10.26. 사망(향년 68세)|1885.12.22.~1901.5.10. 제1·5·7·10대 내각총리대신|1905.12.21.~1909.6.13. 초대 한국통감(韓國統監 *서울 부임은 1906.3.2.)

●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 1852.2.24.~1919.11.3. 사망(향년 67세)|1910.5.30.~1910.10.1. 제3대 한국통감|1910.10.1.~.1916.10.14. 초대 조선총독(朝鮮総督)


■ 1910.8.29. 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조약 )
일본제국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910.5.30.~1910.10.1. 제3대 한국통감|1910.10.1.~.1916.10.14. 초대 조선총독)는 한국통감으로 부임 전 병합준비위원회(倂合準備委員會)를 구성하여 실무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는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 1871.1.23.~1944.12.22.)를 필두로 통감부와 일본내각, 법제국, 척식국 등에 속한 일본 관리들이 참여하여 1910년 6월 하순부터 7월 초 사이에 한국 처리방침을 결정하였는데, 구라치 정무국장은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한다는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 '병합(倂合)'이란 용어를 새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910.5.30. 육군대신을 겸임하면서 제3대 한국통감에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병합조약 체결에 따른 한국인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6.24.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해 대한제국 경찰권을 일본 측에 넘기도록 만들어 이후 6.30.자로 내부 경시청과 경무국, 각 도의 경찰서 등의 기구를 폐지했다. 경찰 사무 총괄 담당자는 한국 주둔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1864.9.1.~1919.10.26.|1918.6.6.~.1919.10.26. 제7대 대만총독)로 그는 헌병 약 1천 명을 증원하였고,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면서 병합에 대비한 치안유지력을 강화하였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일체의 정치적 집회나 연설회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가차 없이 검속·투옥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1910.7.15. 일본 도쿄를 출발하여 7.23. 서울에 들어온 데라우치는 병합 담판을 위해 1910.8.16.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황제와 황족의 존칭과 예우, 공신의 처우, 조약 체결을 위한 이완용의 전권위원 임명 주청 등 7가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전달하였는데, 병합 이후 황제 호칭을 李太公이라 부르자는 일본 측 제안에 이완용은 李王殿下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국호를 朝鮮으로 개칭하는 문제에만 이의를 제기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이에 일본 측도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 황실 칭호 부분만은 양보하여 데라우치는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고치고, 황제는 '이왕(李王)', 태황제는 '태왕(太王) 전하', 황태자는 '왕세자 전하'로 부르는 건을 본국에 보고한 후 이의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어 8.18. 개최된 내각회의에서는 큰 이견 없이 일본 측이 제시한 병합조약 초안을 통과시켰고, 8.22. 오후 1시에 한일합병 조약안(韓日倂合條約案)에 대하여 국무대신(國務大臣)를 비롯하여 황족(皇族) 대표자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회동(會同)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순종(純宗) 황제는 이완용을 조약체결 전권위원으로 하는 위임 부여와 조약안을 재가(裁可)하고 통치권을 양여(讓與)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령(詔令)을 내렸다. 이 조칙에 순종의 서명과 국새를 날인(捺印)했다. 임금의 서명과 옥새를 날인하는 것을 어명 어새(御名 御璽)라 한다.
○ 詔勅(조칙)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 융희4년(隆熙四年) 1910.8.22.
■ 조칙(詔勅) 원서(原書)

- 무술년(庚戌年) 1910.8.22. 이때의 양국은 대한제국(大韓帝國) 제2대 순종황제(당시 36세) 재위(隆熙 융희 4년)와 일본(당시 정식국호: 대일본제국) 메이지천황(또는 명치천황 당시 57세) 재위(메이지 또는 明治 명치 43년) 시절이었다.
이 날 오후 4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통감자작(統監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約)을 체결(調印 조인)하고 양 기명·날인했다.
○ 條約(조약)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히고자 한다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그리하여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고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한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后妃)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과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하기로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와 작위를 주고, 또한 은사금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서 적은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가 있고 충실하게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융희4년 1910.8.22.)
內閣總理大臣 李完用(내각총리대신 이완용)
明治四十三年八月卄二日(명치43년 1910.8.22.)
統監子爵 寺內正毅(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한국 병합조약(倂合條約) 원서(原書)

■ 순종실록(純宗實錄) 4권(순종3년 2010.8.22.) 기록 병합조약(倂合條約)

■ 일본 병합조약(倂合條約) 사본(寫本)

- 이 한일병합조약은 총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조에서 한국 황제가 통치권을 일본국의 천황에게 양여(讓與)하고, 제2조에서 천황이 제의를 수락하여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병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조약의 공포일은 애초 8.26.로 정했지만, 그 다음 날인 순종의 즉위기념일로 인해 8.29.로 조정되었다. 일주일 후 8.29. 순종황제는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의 통치권을 양도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칙유(勅諭)를 작성하여 대한제국 관보(당시 관보 담당부서는 내각법제국관보과: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 卽位 즉위 직전인 1907.6.17. 설치되어 이 합병조약을 공포한 1910.8.29.을 끝으로 순종의 退位 퇴위와 함께 폐지됨)에 게재하여 조약안을 공포하였고, 일본 역시 동일자(同日子)로 추밀원(樞密院 국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자문하는 천황의 자문기구)의 자순(咨詢)을 거쳐 천황의 재가(裁可)와 조서(詔書 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로써 일본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되었다.
○ 勅諭(칙유)
황제는 이르노라.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왕업(王業)을 이어 받들어 임어(臨御)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 정령(維新政令)에 관하여 속히 도모하고 여러모로 시험하여 힘써온 것이 일찍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되 줄곧 쌓여진 나약함이 고질을 이루고 피폐(疲弊)가 극도(極度)에 이르러 단시일 사이에 만회(挽回)할 조처를 바랄 수 없으니, 밤중에 우려(憂慮)가 되어 뒷갈망을 잘할 계책이 망연(茫然)한지라. 이대로 버려두어 더욱 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할 방법과 혁신(革新)의 공효(功效)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짐이 이에 구연(瞿然)히 안으로 반성하고, 확연(確然)히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권(統治權)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信任)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讓與)하여 밖으로 동양(東洋)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民生)을 보전케 하노니, 오직 그대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라의 형편과 시기의 적절함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동요하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히 하며 일본 제국(日本帝國)의 문명 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짐의 오늘 이 거조는 그대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구활(救活)하자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 신민(臣民) 등은 짐의 이 뜻을 잘 체득하라.
- 융희4년(隆熙四年) 1910.8.29.
■ 칙유(勅諭) 원서(原書)

그런데 이 칙유(勅諭)에는 국새(國璽) 즉, 어세(御璽)만 날인되고 임금의 서명 즉, 御名(어명)이 없다. 이 국새(國璽)도 선친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국새인 칙명지보(勅命之寶)를 사용하여 날인하였다.
■ 국새(國璽): 칙명지보(勅命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칙명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5.9. 제작함 |
그 이유로 "순종이 병합조약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황제의 칙유(勅諭)안에 몹시 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고종의 칙명지보(勅命之寶)를 날인하여 황제가 승인한 것처럼 만들었다. 조칙(詔勅) 제20책에 수록된 융희4년 1910.8.29. 칙유(勅諭)에는 순종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부분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위 ①조칙(詔勅) ②조약(條約) ③칙유(勅諭)이 함께 실린 관보(官報)

✓ 이 조약은 정식명칭이 없다보니 이름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당시 일본에서의 조약 문서에 쓰인 공식명칭은 조약 제4호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당시: 韓國倂合ニ關スル條約→1949년 以後 新字体 등: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이고, 약칭(略稱)은 한국병합조약(韓國倂合條約)·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부른다.
한국에서의 통분(痛憤)의 이칭(異稱)인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제병탄(日帝倂呑), 한일병탄(韓日倂呑), 을사늑약(乙巳勒約), 병합늑약(韓國倂合勒約)·한국병합늑약(韓國倂合勒約) 등으로 부른다.
이외 한일합병(韓日合倂),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제2차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을사조약(乙巳條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한일협상조약(韓協商條約), 한일외교권위탁조약안(韓日外交權委託條約案) 등 여러 호칭(呼稱)이 사용되고 있다.
✔ 당시 일본제국 연호 明治(명치) 43년이던 해인 서기 1910.8.29. 한일병합 조약을 공포한 이날 일본제국 메이지(明治) 천황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조선(朝鮮)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칙령(勅令) 제318호 조서(詔書)를 내려 공포하였다. 이때부터 국호(國號) 대한제국은 1945.8.15. 광복이 되기까지 일본제국의 외지 영토인 '조선(朝鮮)'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영어권: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Korea under Japanese rule)이라고 표현함.
○ 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
-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조선(朝鮮)이라고 부르는 건
짐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고 부르는 건을 재가(裁可)하여 이를 공포(公布)하노라.
御名 御璽(어명 어새: 조서에 찍는 천황의 서명-御名과 도장-御璽 즉, 서명날인-署名捺印)
명치(明治) 43년 8월 29일(서기 1910.8.29.)
內閣總理大臣(내각총리대신) 侯爵(후작) 桂太郎(계태랑-가쓰라 다로)
◦ 勅令 第三十八號(칙령 제318호)
韓國ノ國號ハ之ヲ改メ爾今朝鮮ト稱ス
-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朝鮮)이라 칭한다.
附則(부칙)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 본 령(令)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국호 조선(朝鮮) 개칭 건(件) 원서(原書)

-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에 병탄(倂呑)되었고, 이에 일본은 본격적인 조선 식민지(植民地) 통치(统治)를 위해 1910.10.1. 조선총독부(朝鮮総督府)를 설치하였다.
✔ 전술한바와 같이 1905.11.17. 일본이 강제하여 체결된 이른바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乙巳條約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이 되었다. 즉, 보호국이 피보호국에 대하여 제3국의 간섭과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의 의무를 지고, 피보호국은 외교관계 등에 있어 보호국의 통제에 따르거나 외교권을 위임하는 등 주권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는 보호국(保護國)으로서 일본제국은 한국의 내정간섭과 섭정(攝政)으로의 초기 식민지화(植民地化 colonization) 과정에 돌입(突入)하게 된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일본은 1905.11.23.(明治 명치 38년) 일본 칙령(勅令) 제240호로 '한국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統監府 및 理事廳을 設置하는 件|원제: 韓國二統監府及理事廳ヲ置クノ件)'을 공포하고 서울에 총독부(統監府)를, 서울·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 기타 필요지역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05.12.20.(明治 명치 38년) 일본 칙령 제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원제: 統監府及理事廳官制)'를 공포하면서 기존 주한일본공사관을 폐쇄하고 1906.2.1. 대한제국 한성(漢城: 대한제국 수도로 현 서울)에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하여 그 감독기관인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Residency-General of Korea|1906.1.31. 주한일본공사관을 폐쇄하고 2.1.부터 업무 개시)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임시 통감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재임기간: 1906.2.1.~1906.3.1.)가 부임하고, 이어 초대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 재임기간: 1905.12.21.~1909.6.13. *서울 부임은 1906.3.2.),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재임기간: 1909.6.14.~1910.5.30.),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 재임기간: 1910.5.30.~1910.10.1.)가 각 부임하게 된다.
앞서 1905.11.17.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면서 고종 재위 광무(光武) 8년인 1906.2.1. 한성(漢城)에 정치와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통감부(제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설치하였는데, 이번 한일병합조약 후에 이 통감부를 1910.10.1. 조선총독부로 개칭 출범하여 앞서 3대 통감으로 이번 한일병합조약 실무를 맡았던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가(寺内正毅 사내정의|재임기간: 1910.10.1.~1916.10.14.)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제 구(舊) 대한제국은 이전 조선(朝鮮 ちょうせん Chōsen|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 日本統治時代の朝鮮이라고 표현)의 명칭으로 다시 환원되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지 행정구역으로서 무단 점거되면서 일본령 조선 경성부(京城府 ケイジヤウ)에 신설된 이 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통치와 지휘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1945.8.15.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35년(34년 11개월)에 걸쳐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5.9.3. 미군정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고 1945.9.28.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 이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마친 후 통감자작(統監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는 그 전말을 상세히 정리하여 가쓰라 다로(桂太郞 계태랑 1848.1.4.~1913.10.10. 사망|제11·13·15대 내각총리대신) 내각총리대신에게 '한국병합시말(韓國倂合始末)'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같은 해인 1910.11.7. 제출하였다. 그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10.11.21(明治 명치43년) 朝鮮總督報告 韓國併合始末(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의 날짜·시간별 주요 내용
○ 1910.7.23.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국통감(韓国統監) 부임(재임기간: 1910.5.30.~1910.10.1.)
○ 1910.8.16.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 관저에서 이완용 면담
가. 조약 체결을 위한 이완용 설득
나. 합의적 조약으로써 '시국 해결'을 강조
1) 준비한 병합늑약 체결을 위한 각서 제시
2) 조약 체결의 순서 강조
가) 내각회의와 합의
나) 조약체결을 위해 전권위원 임명 주청
다) 내각총리대신과 통감이 조약 체결
○ 1910.8.17. 이완용 오전 10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에게 각원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오후 8시까지 확답 유예 통보 - 각원과 협의, 전원 동의 얻는데 실패
○ 1910.8.18.
1.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면담
가. 각원의 의견을 모아 조약 체결 착수를 주의
나. 휴대한 조약안 및 조약 전문(前文) 제시 및 설명
다. 순종(純宗) 황제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조약체결의 전권위원에 임명하는 勅書(칙서) 제시
2.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조약안 동의
3.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내각회의 개최
가.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통해 내무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설득
나. 학부대신 이용직 병합 반대
○ 1910.8.19.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궁내부대신 민종석, 시종원경 윤덕영에게 시국해결 대요(大要) 설명
○ 1910.8.20.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어전회의(御前會議: 임금의 앞에서 중신들이 모여 국가 대사를 의논하던 회의) 준비 지시
○ 1910.8.22.
◦ 오전 10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궁내부대신 민종석과 시종원경 윤덕영을 관저로 불러 설득
◦ 오전 11시 황제 순종(純宗), 오후 1시 어전회의(御前會議) 지시
◦ 오후 2시 어전회의에서 황제 순종(純宗)이 조약체결의 전권위임장(수임자 受任者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 친히 서명, 국새(國璽)를 누르게 함. 조약안 가납재가(嘉納裁可)1)
◦ 오후 4시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관저 방문
1.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전권위임의 칙서(勅書)2) 사열(査閱)3) 후 승인
2.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이완용 양문의 조약 각 2통 기명(記名)4)·조인(調印)5)
◦ 오후 5시 궁내부대신·시종원경, 통감(統監) 관저 방문 순종황제의 선지(宣旨)6) 전달
※ 용어 정의
1) 가납(嘉納):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고치도록 권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임. 바치는 물건을 기꺼이 받아들임.
1) 재가(裁可):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2) 칙서(勅書): 임금이 특정인에게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이나 문서
3) 사열(査閱):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죽 살펴봄
4) 기명(記名): 이름을 적음
5) 조인(調印): 서로 약속하여 만든 문서에 도장을 찍음.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문에 동의하여 서명하는 일
6) 선지(宣旨): 임금의 명령(命令)을 널리 선포(宣布)함. 전위(傳位)한 상왕(上王)의 전지(傳旨)
☞ 한국병합시말(韓国併合始末 총 80면) PDF 파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훈장·포장·표창 비교] 상훈제도 역사|최초 훈장조례와 법률 변천 (0) | 2025.04.27 |
|---|---|
| 해병대 창설·해체·재창설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0) | 2024.07.26 |
| 군 복무기간 변천사|연도별 군 복무기간 단축 경과(1945~현재) (0) | 2024.07.15 |
| 연도별 군 정원(연도별 병력 수) (0) | 2024.07.14 |
| 한국의 군 계급·병과·정년 및 현 장성계급의 보직(補職) (0)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