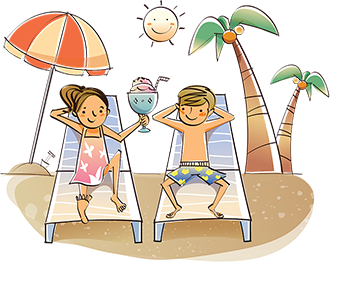2015.11.7 강위석(시인)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라도 한 쪽에는 공급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비자가 있을 때가 많다. 부모는 사랑의 공급자이고 아기는 그 소비자인 것처럼 말이다. 공급자는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배달하는 데까지의 전문가다. 소비자는 그것을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점적 전문가다. 나는 이 글을 역사 지식의 한 소비자로서 쓰려고 한다.
역사 지식이 그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흐름의 전말(顚末)에 얽힌 인과(因果) 관계의 실례(實例)를 얻는 것이다. 지혜로운 정책, 어진 정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알려 준다. 문자 발명 이후 많은 정보나 지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관된 지식을 편집하여 통시화(通時化)하면 그것은 사서(史書)가 된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사서가 실은 일기를 편집한 것이잖은가. 당면한 현안을 처리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훌륭한 참고 자료를 이런 사서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효용으로는 이야기 내지 지식 자체가 주는 인문학적 호기심과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TV 사극 시리즈에서 재현되는 옛날 일은 예술이나 교훈을 떠나 지식 자체와 결부된 효용을 줄 수 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때의 뿌듯함”이라고나 할까. 다만 얄궂은 것은 이 경우 그 지식의 정오(正誤)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이 민족사나 국사일 경우에는 민족애 또는 애국심 함양 효과가 있다. 민족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正體性)을 역사에서 찾고 민족의 자결권을 염원하게 한다.
민족주의라는 것이 태동한 것은 18세기 유럽이었다. 민족과 거기에 걸맞은 신화와 영웅들을 급조하였다. 왕권에 대립하는 인민 주권,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침략에 대비하는 민족적 정체성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효과는 개인은 민족이라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집단주의에의 경사(傾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가의 인민에 대한 통치 권력의 강도를 인민 스스로 올려주기도 한다. 집단화된 애국심은 자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다. 다른 민족이나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폐쇄적 태도를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 쉽사리 적대감까지 촉발시키기도 한다.
인민의 애국 애족 감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정치판이다. 특히 포퓰리스트들은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것을 표 모으는 전략으로 삼기 일쑤다.
역사 지식의 공급자는 사학자들이다. 교사와 출판사 등은 강의와 출판을 맡음으로써 공급자 진영에 가담한다. 나는 이들과 이들이 공급하는 역사책을 사진에 비유하고 싶다. 보도 사진이든 예술 사진이든 사진 작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피사체가 아니다. 한 사진가의 작품으로서의 사진이다. 거기에는 진실이나 아름다움은 몰라도 의도와 솜씨는 반드시 들어 있게 된다. 사진가는 우선 무엇을 찍을까를 고르는 선택을 한다. 무한히 많은 후보 피사체 가운데 특별히 어느 하나를 골랐다면 이것은 제작 행위의 출발이다. 그 밖에도, 촬영의 각도, 거리, 시점, 사진기의 노출, 셔터 속도... 이런 수다한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하는 것이 모두 제작 행위다.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사진’이라는 단어에 내장되어 있는 개념의 속임수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넘어가 있다. 사진은 사진기에 의하여 피사체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정직하며 정확하게 재생한 것이라는 개념 말이다.
사진이 피사체가 아닌 것처럼 역사는 사실(史實)이 아니다. 사실(史實)을 사관(史觀)이나 사학(史學)의 렌즈 밑을 통과시켜 만들어 내는 일그러진 편집(編輯)이다.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편집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민족주의다.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이니라.”라고 갈파한 신채호의 사관이 바로 민족주의 사관이다. 여기서 아(我)는 말할 것도 없이 한민족이고 비아(非我)의 대표는 일본이다. 신채호의 이 이념적 명제는 좌파 민족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비아(非我)와 투쟁하지 않는 사실(史實)은 아(我)의 역사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남한이 이룩한 자유로운 사회도, 개방된 문화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경제적 풍요도 역사책에서 제외시키든가 최소화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이 연장되기도 한다. 비아(非我)와 투쟁하지 않는 아(我)는 비아(非我)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이 좌경 역사 지식 공급자들은 자유를 타락으로, 개방을 식민지적 굴종으로, 풍요를 착취로 매겨 낸다. 한 마디로 북한은 아(我), 남한은 비아(非我)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 역사책의 일반 소비자들이 분노하게 된다. 그들은 중등학교 학생의 학부형일 수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장차 채용할 기업 간부일 수도 있다. 역사책 또는 역사공부 소비자에게 책이나 교사를 선택할 자유를 주면 이런 공급은 쉽사리 시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는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다.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과 IT가 제공하는 공시적(共時的) 정보가 역사가 제공하는 통시적(通時的) 정보보다 훨씬 더 가득성(可得性)과 유용성(有用性)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큰 하나다.
북한 쪽으로 편향된 역사를 공급하는 것은 남한의 안보에 대한 ‘간접 침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측면에 강박(强迫)된 나머지 지금 정치권력이 역사 지식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국정 교과서 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대의(大義)에도 맞지 않고 전략의 효율도 떨어진다. 대혼란만 초래할 기미도 있다. 공급자들에게는 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왕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 간접 침략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민족주의 하나만으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전체 흐름을 편집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상고사는 비과학적 신화에 기탁하고 중간은 왕들과 영웅들의 성공과 실패담이 줄거리를 이루고 근대 이후의 역사는 과학적인 실용주의를 그 패러다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는 치열한 경쟁 마당에 집어넣고 소비자에겐 추상같은 주권을 주면 이런 역사책이 나올 것 같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일경제 회생은 공짜가 아니다 (0) | 2016.02.01 |
|---|---|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0) | 2016.01.10 |
| 지록위마(指鹿爲馬) 연상케 하는 노사정 대타협 (0) | 2015.12.11 |
| 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 (0) | 2015.12.11 |
| 고용세습 위해 비정규직 내친 민노총 (0) | 2015.12.11 |